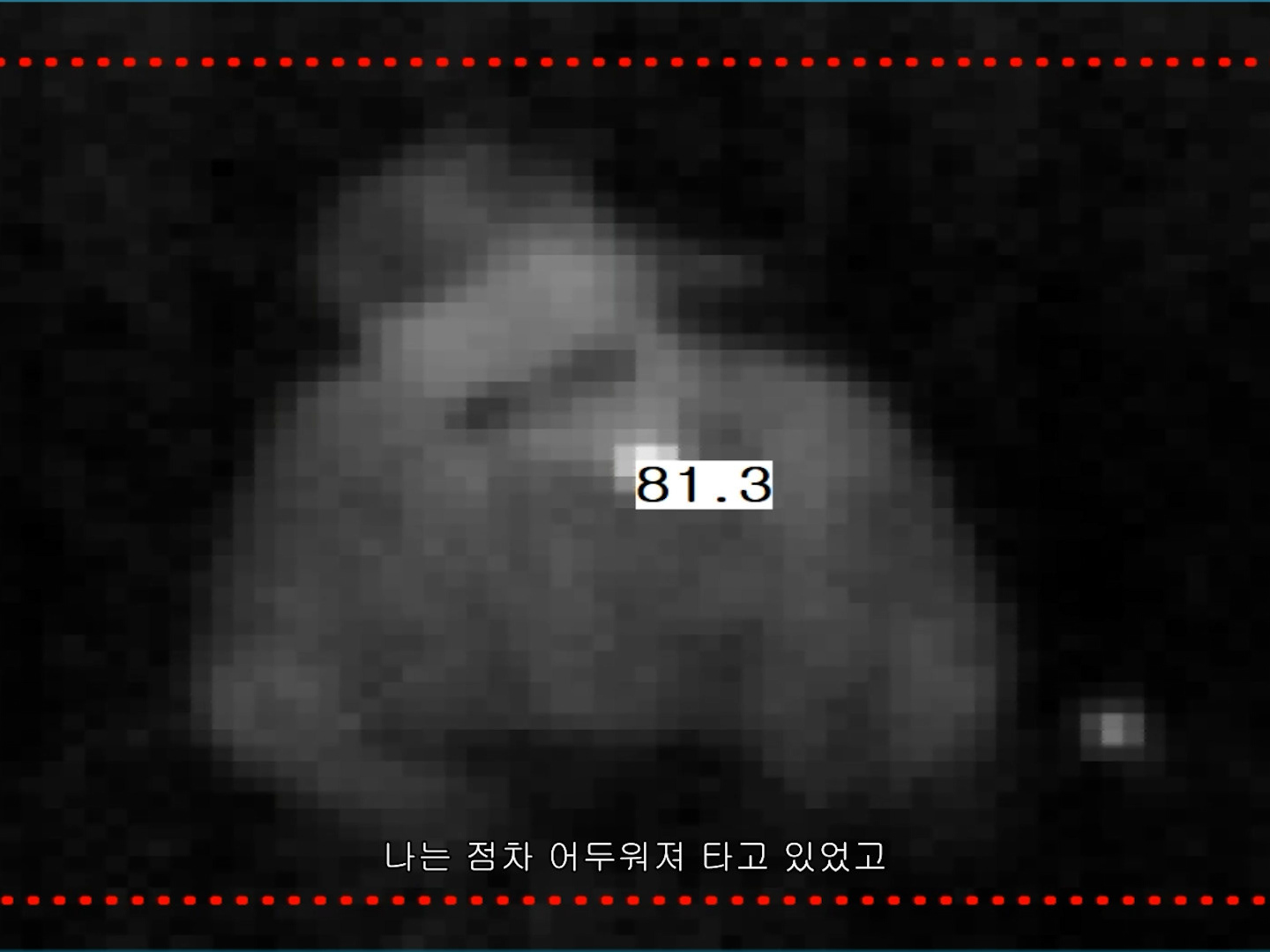Review, 2020, Digital print, 160×90cm
Review
타인을 손쉽게 파악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러온 소통의 간소화는 취향을 배설하고
다시 그것을 파헤치는 굴레 안에서 반복된다.
시간의 흐름으로 따진다면 쓰레기를 버린 후 그것을 주워 파헤치는 것이 순서에 맞겠지만,
사실 그 인과관계는 중요하지 않다.
우리는 타자를 섭취하면서 그의 세계를 무너뜨리고
다시 내가 먹히면서 나 또한 무너진다는 오래된 진리를 떠올려본다.
<Review> 연작은 그렇게 얇아진 인간의 감정층들이 왜 그리도 쉽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지 보여준다.
무언가 새로운 물건을 소개할 때 초점을 옮기기 위해 손바닥을 뒤쪽으로 펴는 것은
언박싱 영상의 상징적인 제스처가 되었다.
결국 조그마한 화면 속에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붙들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 현대의 생산 메커니즘은, 끔찍한 사건과 사고마저도 자신의 구조 안으로 포섭하였다.
자본과 결탁된 이미지들은 인간 개체 하나하나의 정체성과 행적을 부검하듯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도그마적 집착을 만들어냈고, 그만큼 사건의 심각성은 화면 속
비트로 축소되고 스펙터클로 소비된다.
진실과 본질로 위장한 불꽃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어서 손을 대면 뜨거움에 소스라칠 것이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어루만짐은 그 시도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.
정덕용 작가는 동시대의 새로운 감각 아래로 침잠된 잉여들을 돌아보는 것을 기꺼이 한다. 온전히 손에 쥐어낼 순 없어도 그 안에 묻어져 쉬쉬하던 이야기들을 비추는 것을,
편리를 위해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고개를 돌려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.
Review-1cm, 2020, Digital print, 120×80cm
Review-6cm, 2020, Digital print, 120×80cm
Review-12cm, 2020, Digital print, 120×80cm
Review-18cm, 2020, Digital print, 120×80cm
Review-25cm, 2020, Digital print, 120×80cm
Review-26cm, 2020, Digital print, 120×80cm
Review-100cm, 2020, Digital print, 160×90cm